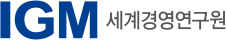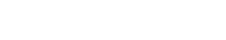[칼럼] 조직마다 꼭 있는 저성과자, 어떻게 관리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23-09-20 10:22 조회 4,042 댓글 0본문
질소·인산·칼륨·석회 등 식물 성장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아무리 다른 요소가 넘치게
많아도 식물이 자랄 수 없다고 한다. 1840년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리비히는 이를 두고 ‘최소량의 법칙(law of minimum)’이라고 정의했다.
최대가 아닌 최소가 성장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비단 식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미 잘하고
있는 구성원을 더 잘하도록 하는 것보다 가장 약한 구성원을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팀 전체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비유하자면 어느 반의 평균이 70점이라고 할 때 90점을 받는 학생이 성적을 더 올리도록 하는 것보다 30점을 받는
학생의 점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반 평균을 높이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조직의 성과를 책임지는 리더에게 저성과자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렇다면 리더는 저성과자의 성과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유형1.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우선 성과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산업조직심리학
등 현대 심리학 분야의 선구자, 쿠르트 레빈은 ‘성과(performance)’란 업무 능력(ability)과 동기(motivation)의 곱’이라는 성과 방정식을 제시한 바 있다. 대입해 보면 저성과자는 업무 능력과 동기 중 어느 한 쪽이 현저히 낮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저성과자 중에서도 업무 능력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이들의
특징을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마음처럼 일이 잘되지 않아 스스로도 답답할 때가 많다.
일찍 출근해 야근까지 하는 등 쏟는 에너지는 많은데 목표 달성은 좀처럼 되지 않는다. 업무 처리 속도도 남들보다 확연히 뒤처지고 그 결과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기도 한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이들을 옆에서 지켜보자면 몇 가지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해당 업무에 필수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하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또는 일의 맥락을 읽지 못해 방향을 영 잘못 잡기도 한다. 그 결과
소위 ‘삽질’을 하게 된다.
본인의 강점이나 재능이 업무에 맞지 않거나 타고난 기질 자체가 불필요한 완벽주의 성향이어서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성과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딱하고 안타까운 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리더는 이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체 어디에서 빈틈이 발생하는지 역량의 구멍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논리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구멍을 발견했다면 이를 채울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때 ‘족집게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해당 업무에 노하우가 있는 선배나
다른 구성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포인트만 콕콕 짚어 주는 ‘핀셋형 코칭’은 성장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업무 섀도잉(shadowing)’이 있다. 코치가 될 만한 다른 구성원의 업무
과정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간접 경험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체득할 수 있다. 섀도잉하는 업무 중 일부를 직접 해 볼 수 있게 한다면 학습 효과는 더욱
커진다.
이들에게는 업무 지시도 달라야 한다. 업무 능력이 낮은 저성과자에게는
일반 구성원보다 수행 기간을 길게 잡아 미리 지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지시 내용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꼭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령 “이번 업무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김 대리가 이해한 대로 한 번 설명해 보겠어요”와 같은 질문으로 그의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덧붙여 이들에게는 업무 단위를 잘게 쪼개고 자주 중간 피드백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들이 목표한 바를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리더는 옆에서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를 자처해야 한다.
유형2. 동기 부여가 낮은 경우
다음으로 동기가 낮은 저성과자를 살펴보자. 이들은 업무 수행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성과가 나지 않는다. 이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면 이상한 일도 아니다.
집요하지 않고 매사 대충, 늘 하던 일은 미루거나 새로운 일은 피하기
일쑤다. 한마디로 영혼 없이 일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들도
처음부터 동기와 의욕이 낮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느 순간 열정의 불씨가 사그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심리학자 존 윌리엄 애킨슨의 ‘기대-가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동기는 기대 요인과 가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저성과자는 업무 난이도가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워 의욕이 떨어졌거나 본인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기대 요인이
낮을 수 있다.
혹은 업무 수행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낮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
가치는 흥미 요소나 효용성 등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저성과자가 느끼기에 하는 일이 지루하거나 본인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동기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리더는 저성과자의 동기를 결정하는 다양한 기대 요인과 가치 요인 중 어떤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
잡아내야 한다. “무엇이 문제야”라고 물어본다고 상대가 솔직하게
답할 리 없다.
핵심은 관찰이다. 관찰은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나 현상을 살펴보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리더도 사람이다 보니 저성과자를 ‘찍어 놓고’ 보게 된다.
‘김 대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별로 열심히 안 할 것 같은데…’, ‘매사 저런 식이지… 성의가 없어’ 등 이미 고정된 관점, 즉 선입견과 편견으로 저성과자를 대할 수
있다.
이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리더는 상대를 더욱 통제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행동보다 문제 행동을 기가 막히게 포착해 낸다.
통제와 감독은 더욱 심해지고 구성원의 의욕은 이전보다 더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긴다. 결국 상대는 ‘골렘 효과(golem
effect)’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은 피그말리온 효과의 반대로, 타인의 부정적인 기대와 관심이 실제로 낮은 성과와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리더라면 저성과자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잠깐 내려놓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대를 살피고 그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최대한 헤아려 듣고 질문해야 한다.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나면 리더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최대한 에너지를 집중하자.
예를 들어 리더는 적극적으로 업무 난이도를 조정해 주거나 흥미나 강점이 있는 업무를 제시할 수 있다.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커리어에 대한 고민 때문이라면 다양한 업무를 시도해 보고 실패해도 아직 괜찮다고
느낄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지지해 줘야 한다.
리더에게 저성과자 관리만큼 유독 힘든 일도 없을 것이다. 자기 뜻대로
가장 안 되고 답을 찾기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 관리이기 때문이다. 뜻하지 않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리더 본인이 상처를 입을 때도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조직 전체의 성과를 위해서도,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서도
저성과자 관리는 리더의 책무다.
그 무엇보다 구성원을 성과를 내는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책임이 있듯이 리더라면 구성원을 성장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느릿느릿 따라오는 구성원에
에너지를 쏟는 일이 고단하겠지만 저성과자가 오롯이 설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경험은 리더십 챌린지이자 성취하고 나면 리더 자신도 한 단계 성장하는
일이 될 것이다.
김민경 IGM세계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 IGM 세계경영연구원은 한경 비즈니스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