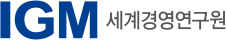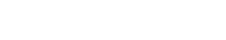[칼럼] 이미 협상 성패가 결정됐다고? 판을 뒤바꾸는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24-08-21 18:47 조회 2,434 댓글 0본문
협상 성공을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적극적인 경청, 관점의 전환, 다양한 옵션 제안, 상호 신뢰 구축, 보디랭귀지 해석 등이다. 이런 방법은 어떤 협상이든 꽤 효과가 있다. 이른바 협상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자. 협상 상황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경우 협상가의 운신 폭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그 폭은 좁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관점을 전환해도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상대 생각을 바꿔줘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상대도 나름의 입장이 있고 논리가 있어서다. 결국 협상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협상은 시작 전에 성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협상 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미리 설계해 보자.
3단계 협상법
하버드대 경영대학의 제임스 세베니우스
교수는 데이비드 렉스와 공동으로 저술한 ‘3D 협상(3D
Negotiation)’을 통해 협상은 3단계(레벨 1부터 레벨 3까지)로
나뉜다고 주장한다.
먼저 ‘레벨 1’은 협상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알고 활용하는 단계다. 상대를 끌어오기 위해 협상 전술을 주로 활용한다. 의사소통 방식을
바꾸고 때로는 강경한 술책을 사용한다. 이때 초점은 상대방 ‘개인’에게 맞춰져 있다.
‘레벨 2’는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한다. 파이를 나누기 전에 파이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서로를 만족시키는 창의적인 선택지를 다양하게 개발한다.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이슈’에 맞춰져 있다. 양측이 원하는 가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윈윈하는 방식이다. 여기까지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다. 즉 이미 짜인 판 위에서 협상하는 것이다.
‘레벨 3’의 협상은 상대방 개인이나 해당 이슈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협상장 밖에서 ‘상황’을
조망한 다음 판을 미리 설계한다. 누구부터 협상하는 것이 유리할지 순서를 구상하고, 타결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재조정한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협상 상대를 재구성한 AT&T
미국 내 케이블TV 업계 4위를 기록 중이던 ‘미디어원그룹(Media One Group·이하 미디어원)’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때 인수를 놓고 격돌했던 곳은 미국 통신 업계 1위 AT&T와 케이블TV 업계 1위 컴캐스트(Comcast)였다. 이 상황에 신이 난 건 미디어원이었다. 두 회사의 경쟁 때문에 한껏 몸값이 올라서였다. 당시 여러 여건으로 볼 때 컴캐스트와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별로 없었던 AT&T. 그러나 AT&T는 특이한 전략적 승부를 통해 최후의 승자가 됐다. 어떤 전략이었을까.
AT&T는 협상 대상을 미디어원이 아닌 자사 경쟁사인 컴캐스트로 바꿨다. AT&T가 세부 상황을 살펴보니 양사가 미디어원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자사는 미디어원의 케이블 망을 원했고, 반면 케이블 망을 갖고 있는 컴캐스트는 미디어원의 고객을 원했다. 이런 차이를 파악한 AT&T가 컴캐스트에 이렇게 제안했다.
“귀사가 이번 미디어원 입찰에서 빠진다면, 원하는 고객을 우리가 넘겨주겠다. 우리 소유 케이블 방송사 몇 개와 200만 명의 시청자도 같이 넘겨주겠다. 그 대가로 우리에게 시청자 1인당 4500달러(약 622만원)를 지불해 달라.”
컴캐스트는 AT&T의 이 제안에 흔들렸다. 자사가 원하는 것을 AT&T가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애초 미디어원 인수에 드는 비용보다 오히려 낮은 금액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서였다. 결국 컴캐스트는 AT&T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입찰 테이블엔 AT&T만 남았다. 이제 애가 탄 것은 미디어원이었다. 마땅한 인수 업체가 AT&T 하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AT&T는 과당
경쟁을 피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디어원 인수에 성공했다. 협상 상대를 미디어원에서 컴캐스트로 바꿈으로써
판을 뒤집은 셈이다. 어떤가? 늘 그렇듯 결과를 알고 나면
쉬워 보인다. 하지만 막상 부딪히면 쉽지 않다. 해결 방법은
바로 이해관계자다. 협상과 관련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본다.
참여하고 있는 자와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과에 영향받는 당사자가 누군지 알아보는 것이다. 내가 꼭 이 사람과 협상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져 보는 것이 출발점이다.
협상의 순서를 조정한 소프트웨어
기업 A사
우리는 상대 양보를 유도하기
위해 압박 전술을 쓰거나 시간 지연 전술을 쓰곤 한다. 이런 전술을 쓰는 목적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신의 이익을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함이다. 이는 상황에 따라 제법 잘 통하기도 한다. 하지만 때로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국내 작은 소프트웨어 기업 A사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다. 거대 인터넷 기업 B사와 중요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상대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것이었다. 계약 금액은 적지 않았다. B사 입장에선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A사 입장에선 연간 매출의 대부분이었다. 당시
마음이 급해진 A사는 “고객님, 계약 갱신하셔야죠? 언제쯤 시작하면 좋을까요?”라고 B사에 물었다. B사는 “뭐 그리 급한 것도 아닌데, 천천히 보면서 하시죠”라며 느긋한 태도를 보였다.
몇 번 재촉했지만 반응은 다르지 않았다. 협상 자체에 관심이 없는 듯했다. A사는 난처했다. 혹시 다른 경쟁사를 불러들이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일부러 느긋하게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일까 등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 이때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순순히 백기 투항하겠는가, 아니면 서둘러 중간 지점에서 절충하겠는가?
A사의 대응 방식은 둘 다 아니었다. 상대를 재촉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A사는 더 이상 협상에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순서를 바꿨다. 다른 고객, 사업 파트너 등과 먼저 협상을
벌였다. 가치 사슬 안에 연관된 이해관계자와 소프트웨어 지원 시스템 구축 협의를 다각도로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엔 막연했던 소프트웨어 아이디어가 어느새 제법 훌륭한 사업 대상물이 됐다.
이해관계자 중에는 B사의 경쟁사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두 곳은 A사에 파트너십을 제안했고 덩달아 A사의 영향력이 커지게 됐다. 이제
A사는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다. 오히려 느긋한 마음으로 B사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A사는 재계약에 성공한 것은 물론 계약 금액이 이전보다 다섯 배 가까이 증가했다.
타결 범위를 확대한 발전 회사 C사
국내외 9곳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 회사 C사는 신규 발전소 건설을 위한 사업 구상에 착수한 적이 있다. 발전소의 핵심 요소는 가스터빈 엔진이다. 공개 입찰을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해야 하는데, 사실 마음 속에 점 찍은 곳이 있었다. 바로 중공업 D사였다. 예전에 함께 일한 적도 있고 품질도 좋아 아주 적격이었다.
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D사는 생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까다로운 입찰 조건 때문에 다른 업체는 참가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만약 이대로 진행한다면 중공업 D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99%였다. 하지만 D사의 과도한 금액 요구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다.
난처해진 발전 회사 C사는 중공업 D사와 협상을 어떻게 풀어야 했을까? 해답은 바로 입찰 조건을 바꾸는 것이었다. 다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조건을 대폭 수정했다. 대금 지불 조건 완화, 컨소시엄 참여 허용, 점수 평가 체계 수정, 해외 업체 참여 허용 등의 방법을 통해 다른 업체도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 입찰 상황이 단독에서 경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D사는 자사 외에도 다른 대안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예전처럼 강하게 나올 수만은 없었다. 결국 상대는 애초 금액보다 상당 폭을 낮춰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 협상의 핵심은 타결 범위 확대였다. 상대와 어떻게 협상할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다른 업체와 경쟁 상황에 빠지도록 재편한 것이다.
주어진 상황이라 협상하기 까다로운가? 그렇다면 유리하게 협상의 판을 바꾸라. AT&T처럼 협상의 대상을 바꾸든지, 소프트웨어 기업 A사처럼 순서를 바꾸든지, 아니면 발전 회사 C사처럼 타결 범위를 재조정해 보라.
이태석 IGM세계경영연구원 교수
* IGM 이코노미조선 칼럼을 정리한 글입니다.